[부산일보 2018/11/ 8] [책이 있는 풍경] 제주도와 '김영갑'
그 섬에 내가 있었네/김영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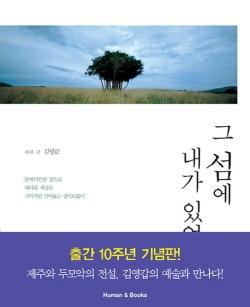
그는 가고 없다. 하늘나라로 간 지 오래다. 그의 이름은 김영갑이다. 제주도의 바람과 구름을, 제주의 자연을 사진에 담아 놓고 간 사진가이다. 아주 오래전 평범한 사진가였던 그는 작업을 위해 몇 번 드나들면서 제주도에 매력을 느껴 아예 정착하게 된다. 그리고 점점 더 제주도와 사랑에 빠져 갔다. 독신이었던 그는 지독한 가난과 싸우면서 그가 사랑하는 제주도를 필름에 담았다.
그런데 자신의 이름이 세상에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할 무렵 루게릭이라는 난치병 진단을 받는다. 힘든 투병이 시작되었고 투병을 하면서 쓰기 시작한 책이 <그 섬에 내가 있었네>이다. 책의 전반부는 자신이 제주도에 흘러들어와 정착하고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과 어울려 작업하는 과정들의 내용이다. 후반부는 루게릭이란 병에 걸린 그가 투병하는 과정과 죽음을 앞두고 그동안 숨겨두었던 가족의 이야기 그리고 갤러리 두모악의 조성에 관한 이야기다.
김영갑은 제주도의 자연이 연출해주는 삽시간의 풍경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제주의 자연 속을 누볐다. 때로는 기다림의 긴 고통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바람 구름 오름 나무 풀을 담기 위해 제주와 한 몸이 되어 살다간 사진가이다. 그가 얼마나 제주도를 사랑했는지는 책 속에 실린 주옥같은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다. 김영갑은 스스로 외로움을 사랑했었다. 가족과의 연락은 이미 오래전이었고, 외부와의 불필요한 연락을 막기 위해 전화마저 반납한다. 전시 때도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기 위해 전시장에 나가지 않았다. 김영갑은 끝없는 외로움 속으로 자신을 몰아갔고 그 외로움의 힘으로 다시 카메라를 메고 들녘을 누볐고 오름엘 올랐다. 그 행위를 그는 수행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책의 말미 '삶과 죽음은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니다. 삶의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 사람 능력 밖의 세계를 나는 믿는다'라는 표현에서 타인들로 하여금 삶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한다. 필자의 경우 김영갑과는 아는 사이다.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되던 그해 초 그를 만났다. 30여 분 이야기를 나눈 후 돌아서는 나에게 보내준 그의 옅은 미소가 생각난다. 그래 그 섬에 그가 있었지.
문진우 사진가